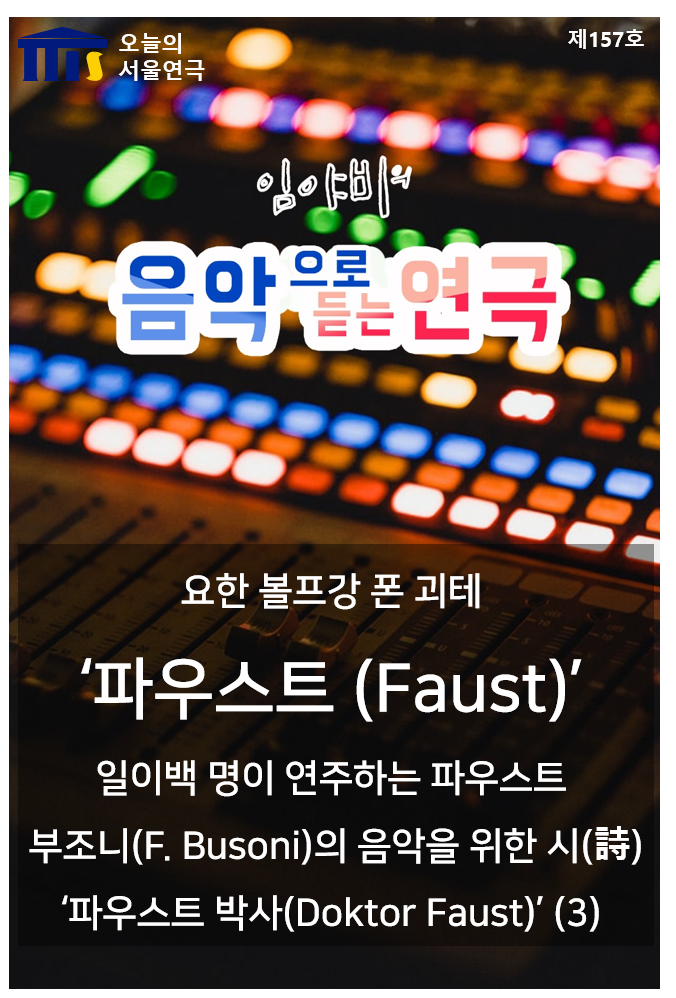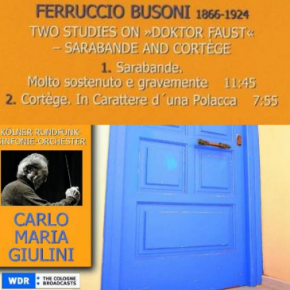글_임야비(tristan-1@daum.net)
소설가, 서울 신포니에타 기획 및 연출
극단 듀공아, 외계 공작소, 동맹, 아레떼 연출부 드라마투르그
부조니(F. Busoni)의 음악을 위한 시(詩)
‘파우스트 박사(Doktor Faust)’ (3)
비극 2부.
서시(序詩)부터 Intermezzo까지 분석한 앞선 연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Scene 1부터 마지막 Epilogue(詩)까지 알아보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조니가 괴테 원작의 ‘파우스트 비극 2부’를 매우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이다.
Scene 1

Scene 1의 첫 장면은 파르마 공작과 공작부인의 화려한 결혼식이다.
이 극에서 가장 유명한 Cortège(축하 행렬)가 연주되면서 하객으로 분한 합창단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Cortège는 부조니가 옛 ‘그랜드 오페라’ 형식을 빌려 작곡한 음악으로, 폴카-목가(牧歌)-사냥 곡-왈츠-미뉴에트로 이어지는 춤곡의 향연이다. 부조니의 치밀한 관현악법이 집약된 이 곡은 따로 분리해서 연주될 정도로 멋진 곡이다.
새신부 파르마 공작부인은 멋진 마법사 파우스트에게 호감을 느낀다.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성사한 파우스트는 이미 욕망덩어리다. 거칠 것이 없는 파우스트는 여러 멋진 마술을 보여주며 공작부인을 유혹한다. 이 중 공작부인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인을 말하면 파우스트가 마법으로 그들을 소환하는 장면이 흥미롭다. 첫 쌍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고, 두 번째는 삼손과 델릴라다. 오케스트라 하프의 우아한 멜로디로 시바 여왕의 상징인 수금(竪琴)을 표현하고, 금관과 합창의 긴장감 넘치는 크레센도로 커다란 가위를 든 델릴라를 강조한다. 작곡가 부조니의 음악적 연출이 반짝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살로메를 소환하는데, 공작부인은 ‘세례 요한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파우스트에게 격렬하게 외친다. 이 대사는 낯선 남자에게 흔들리던 여인의 강렬한 고백이자 무의식적인 발작이다. 불륜의 발화. 대본을 직접 쓴 부조니의 탁월한 극적 연출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둘 사이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공작이 마법을 중단시키고 파티가 끝난다. 이후 홀로 남은 공작부인이 파우스트를 향한 정염의 아리아를 부르고, 그 사이 메피스토펠레스는 잔꾀로 파르마 공작을 속여 파혼을 종용한다.
‘아름다운 신부의 납치’는 파우스트 비극 2부의 3막 ‘헬레나 비극’의 주요 플롯이다. 파르마 공작 부인은 미의 화신인 트로이의 헬레나, 파르마 공작은 오쟁이 진 남편이자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이며, 파우스트는 욕정에 눈이 멀어 유부녀를 꼬드기는 파렴치한 그대로이다. 이처럼 부조니는 파우스트의 음악화(化)에서 ‘비극 1부’보다 훨씬 덜 인용되는 ‘비극 2부’를 전면에 내세워 시극(詩劇)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Symphonisches Intermezzo
막간 음악으로 약 10분 정도의 Symphonisches Intermezzo(교향적 간주곡)이 연주된다. 앞서 설명한 Cortège(축하 행렬)음악과 쌍벽을 이루는 기악곡으로 중세 기사들의 춤곡인 Sarabande(사라방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오한 곡이다. 부조니는 이 곡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교향적 간주곡과 축하 행렬 두 곡을 묶어 ‘파우스트 박사에 의한 2개의 습작’이라는 제목을 붙여 별도로 발표한다.
Scene 2

시끌벅적한 합창과 함께 Scene 2의 막이 오른다. 남자들로 가득한 무대는 비텐베르크의 술집이다. 후끈한 합창을 짊어지고 신학자, 법학자, 철학자가 현학적인 논쟁을 펼친다. 점점 과격해지던 논쟁은 결국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싸움으로 번진다. 내내 시큰둥하게 있던 파우스트가 세속적인 여자 이야기 즉, 자신이 절세 미녀 파르마 공작 부인(헬레나)을 유혹하고 능욕했던 모험담을 풀자 고루했던 남자들의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 버린다.
부조니는 원작 파우스트 비극 2부 4막의 ‘고산준령, 전쟁’과 비극 1부의 ‘라이프치히 아우어바흐 술집’을 하나로 합친다. 이 설정을 통해 부조니는 표면적 풍자와 내면적 고뇌를 동시에 표현한다. 표면적으로 잘 드러난 풍자는 고매한 척하지만 결국 욕망에 집착하는 남자들의 속물근성이다. 멋들어지게 감춰진 다른 하나는 예술가 부조니의 내적 고뇌다. 부조니는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생에 대부분을 베를린에서 활동했다. 부조니 미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이탈리아적인 것과 독일적인 것의 충돌이 있었고, 이 둘의 완벽한 조화는 그가 평생을 바쳐 천착한 예술관이었다. 작가이고 싶었던 작곡가 부조니는 자신의 예술적 고뇌를 로마 가톨릭과 루터로 대표되는 독일 개신교 간의 종교 논쟁으로 넌지시 드러낸다. 오선지 위의 음표와 씨름하는 작곡가가 창조한 연출은 그 어떤 소설가보다 문학적이고, 그 어떤 극작가보다 극적이다.

이때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공작부인이 죽었다고 말하며 트로이의 헬레나 환영을 소환한다. 트로이의 헬레나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괴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자신의 시극 ‘파우스트 박사’를 단단히 묶는 하나의 매듭이다. 부조니는 무대 연출로 환영을 삽입해 3000년 시인의 계보에 슬쩍 자신을 연결한다.
뒤이어 Prologue 1에서 ‘Clavis Astartis Magica‘를 전달했던 세 학생이 등장해 파멸의 시간을 예고한다. 극의 초반, 신비로운 분위기의 세 학생은 파우스트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동방 박사’였지만, 이제는 영혼을 거두는 ‘저승 사자’이자, 파우스트의 명줄을 가지고 노는 ‘운명의 세 여신’이다. 부조니가 이 ‘고지 역할’을 굳이 세 명으로 설정한 이유는 탄생과 죽음의 중의적 의미를 문학적으로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Scene 3

부조니는 대단원인 Scene 3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1924년에 사망했다. 나머지 부분은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Phillip Jarnach가 보필해 완성했다.
무대는 밤 깊은 비텐베르크의 거리다. 야경꾼으로 변장한 메피스토펠레스가 곧 다가올 파우스트의 죽음을 알린다. 반쯤 미친 파우스트가 아기를 안고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지 여인에게 적선하려 한다. 그런데 그 거지 여인은 파르마 공작 부인이었다. 그녀는 파우스트에게 ‘우리 아기는 죽었다!’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사라진다. 이 장면의 모티브 역시 파우스트 비극 2부 제 3막 ‘헬레나 비극’이다. 괴테 원작에서 파우스트는 헬레나 사이에서 아들 ‘에우포리온(발이 가벼운 자)’을 얻지만, 안하무인 에우포리온은 결국 추락해 죽고, 절망한 헬레나는 명계(冥界)로 돌아간다. 이렇게 부조니는 괴테의 비극 중간에서 시극을 마무리 짓는다. 야경꾼 메피스토펠레스가 자정을 알리자 파우스트가 죽는다. 부조니의 시극에는 원작 비극의 구원이 없다.
Epilogue (詩)
서시로 시극의 프롤로그를 시작한 부조니는 에필로그의 시로 비극을 마무리 짓는다.
구원받지 못한 파우스트의 최후이자 작곡가의 마지막 시다.
평가

석 달에 걸쳐 부조니의 “음악을 위한 시(詩) – Dichtung für Musik” 파우스트 박사를 분석했다.
미래의 오페라를 향한 부조니의 혁신적 시도가 공감각적 연출을 타고 빛나는 감동을 만들기도 했지만,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낸 것은 아니었다.
우선 대본의 문제다. 괴테의 비극 ‘파우스트 1, 2부’와 중세 독일 전설인 ‘파우스트 박사’를 너무 많이 섞었다. 그래서 시극의 내용은 부조니의 창작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내용이 뒤죽박죽이다. 이 흩어진 플롯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장치가 필수적인데, 부조니는 ‘Clavis Astartis Magica‘라는 ‘만능 마법 소품’ 하나로 대충 해결했다. 이 소품의 등장은 마치 고대 그리스 연극의 ‘Deus ex machina’처럼 세련되지 못한 극작, 연출이다. 게다가 이 ‘Clavis Astartis Magica‘의 마법력이 너무 강해서, 극적으로 꼬일 대로 꼬인 갈등 상황이 마법 한 방으로 너무 쉽게 풀려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극의 제 2 주인공인 메피스토펠레스의 악마성이 죽어 버린다. ‘만능 마법 소품의 사용’은 파우스트 내부의 고뇌와 인물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부조니 대본의 패착이다.
다른 아쉬운 점은 음악이다. 부조니는 20세기 초의 혁신적인 작곡가였지만, 강렬한 음악가는 아니었다. 보통 ‘혁신’이라 함은 한 방향에 집중해서 기존의 무언가를 깨트리는 힘을 일컫는다. 하지만 부조니의 혁신 방향은 사방팔방이었고, 부조니의 힘은 ‘파괴의 힘’보다는 ‘융합의 힘’에 가까웠다. 이런 ‘온건한 혁신’을 고수하다 보면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음악이 되기 쉽다. 부조니도 이 함정에 걸려든 경우다. ‘파우스트 박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대중들은 강렬한 혁신이 만들어 내는 개성과 자극에 열광하지만, 밋밋한 조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오선지보다는 원고지에 예술을 펼치고 싶어 했던 종합 예술가 부조니.
그의 죽음과 맞바꾼 역작 ‘음악을 위한 시(詩) – 파우스트 박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경탄을 자아내는 장치와 천재적인 연출이 발견된다. 부조니가 시극을 끝내는 에필로그에 남긴 시처럼 미완성작 ‘파우스트 박사’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합금’일지도 모른다.
- 무료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ohskon@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리뷰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ohskon@naver.com으로 원고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