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의 에세이
브레히트는 古典主義 작가인가? (3)
글_이재진(단국대 명예교수)
고전주의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표현할 수 없었던 시기를 암흑시대라 부른다. 인간은 어두움에서 벗어나 점차 새로 태어나게(Renaissance) 된다. 그리스, 로마의 예술작품이 알려지고 이를 모델로 나라마다 인간본연의 모습을 찾아 나섰다. 고전주의시대(Classicism)가 찾아온 것이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Shakespeare), 스페인은 황금시대(Lope de Vega), 프랑스는 바록크 전성시대(Corneille/Molière,), 독일은 낭만주의시대(Goethe/Schiller)였다. 엘리엇(T. S. Eliot. 1888-1965)은 “고전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a Classic? 1944)라는 에세이에서 고전주의의 기능과 역할을 정신, 언어, 도덕성, 문체의 성숙함과 완성도 등에 두었다. 엘리엇은 이에 맞추어 고전주의 작가의 특징을 지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짐은 물론 보편성 통일성으로 가득 넘쳐야 한다고 요약했다. 엘리엇은 이 범주에 세 작가를 넣었다: 단테, 셰익스피어, 괴테. 간단히 정의하면 고전주의 작품은 지역적이고 시대적 이념을, 즉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용되는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멋적긴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 썼던 글이니 슬쩍 한 번 더 적어본다: 내가 제법 글을 쓰는 척하는 것은 어쩌다 조금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여러 고전주의 작가들의 가르침 덕분이다. 언어의 마술은 Shakespeare에게서, 언어의 품위는 Lessing에게서, 언어의 처절함은 Schiller에게서, 언어의 유희는 Kleist에게서, 언어의 조급함은 Büchner에게서, 언어의 야함은 Wedekind에게서, 언어의 간결함은 Brecht에게서, 언어의 재치는 Dürrenmatt에게서, 무엇보다도 언어의 아픔을 나는 Hebbel에게서 훔쳐보았다. 내가 이들 중 한 시인의 서자(庶子)가 되어도 좋다면 단연 헵벨의 이름 아래 조용히 내 이름을 적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를 지금 다시 읽는다면 예전의 그 감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헵벨(1813-1863)을 읽으면 옛날에 조용히 느끼던 그 아픔이 슬며시 베어 나온다. 그분은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모나지 않다.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의 아픔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연스레 비극의 장면 사이마다 흥건히 젖어있는 것이다. 헵벨은 비엔나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 그곳에 갔었지만, 그분의 무덤을 찾아보지는 못했다. 그곳을 또 한 번 찾아보라는 하늘의 뜻이 들리는 듯 하다.

브레히트는 시대극(時代劇)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한 시대의 문제를, 한 지역의 고민을 작품 속에 담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고전주의 작가가 되고 싶었다. 브레히트는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감추지 않았다. “나는 헵벨 보다 더 진지하게 쓸 수 있어, 베데킨트 보다 더 거칠고 생생하게 쓸 수 있다고!”
호라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수확”(Die Ernte. 1913-1914)이란 학교문예지를 만들었다. 그곳에 [성경]이란 작품을 실었다. 브레히트의 처녀작이다: 신교와 구교가 싸운다. 끝내 프로테스탄트는 무릎을 꿇게 된다. 카톨릭 사령관은 항복의 조건으로 이 마을의 어린 처녀를 하룻밤 자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한다. 소녀의 아버지, 오빠는 마을을 위해 희생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할아버지와 처녀아이는 이를 반대한다. 마을은 완전히 파괴된다. 이 주제는 (전쟁, 애국, 희생) 브레히트의 많은 작품 속에 깔려있다.

브레히트의 학교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수’는 없었고 라틴어, 독일어 등 몇 과목에 ‘우’를 받았다. 브레히트가 좋아하던 작문시간이었다. 호라츠(Horaz. 65-8 BC)의 송가, “조국을 위해 죽는다면 그 얼마나 감미롭고 영광스러울까”(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It is sweet and glorious to die for the fatherland.)를 과제로 받았다. 1차 대전에 휘말려있던 그 당시의 시대분위기와 너무 잘 맞는 주제였다. 브레히트는 호라츠의 송가는 정치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죽음이 어찌 감미롭고 어찌 영광스럽단 말인가! 죽음이란 침대건 전쟁터건 늘 힘들고 슬픈 것인데, 특히 꽃다운 젊은이들이 삶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런 일인가! 아울러 이 시기에 브레히트는 괴테, 실러의 독일고전주의와 거리를 두었다. 고전주의 작품은 대체로 시대정신에, “맹목적인 애국심에” 즉 쇼비니즘(chauvinism)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인(극작가)으로서는 실러와 같은 자리에 오르리라 마음먹었다.
요스트와 브레히트
뮌헨 대학교 입학해서 쿠처(Artur Kutscher. 1878-1960) 교수의 연극세미나에 참여했다. 쿠처 교수는 연극은 모방(mimic/연기)의 예술이니 문학으로 즉 이론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연극학의 틀을 세우고 있었다(근래에 벗어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독일연극학은 독문학의 가지에 머물러 있다.). “작가와의 만남”이란 쿠처 교수의 수업에는 여러 유명 작가들이 초대되었다. 특히 브레히트는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베데킨트의 수업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쿠처 교수는 브레히트보다는 요스트(Hanns Johst. 1890-1978)를 재주 있는 유능한 학생으로 받아들였다. 세미나 작업의 일환으로 요스트는 [외로운 사람](Der Einsame. 1917)이란 작품을 제출했다. 그 당시 거의 이름도 희미해진 천재 극작가 그라베(Christian Dietrich Grabbe. 1801-1836)의 생애를 다룬 비극이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시대에 앞서가기에 동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다가 외로움 속에 끝내 쓰러진다. 1918년 [외로운 사람]이 무대에 올랐다. 브레히트는 샘도 나고 화도 났다. 자기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작품인데 세간의 주목을 받으니 말이다! 브레히트는 그 작품을 “끔찍한 표현주의 작품”이라며 본때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한 달 반 만에 작품을 써낸다. 원래 4일 만에 완성하겠다고 친구와 내기를 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태어난 브레히트의 첫 번째([성경]을 목록에서 뺀다면!) 희곡작품이 [바알](Baal. 1917)이다.

바알
원래 제목은 [바알 먹어대다! 바알 춤을 추다! 바알 환희에 빠지다!]이다. 바알은 시리아 지역에서는 수확의 신으로 높이 섬기지만 기독교에서는 악마로 내려앉는다. 요스트는 천재시인의 몰락을 거창할 정도로 감상적으로 형상화 시켰다. 전형적인 표현주의 양식의 극이었다. 이에 반해 브레히트의 주인공 바알은 자연에 순응하며 술과 여인에 취해 노래하는 반사회적 인간이다. 요스트 작품의 주인공 그라베는 시인이다. 대중들은 천재 시인의 높은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시민들의 오해와 거부 때문에 결국 좌절한다. 브레히트의 주인공도 시인이다. 바알은 거칠고 삶에 탐닉한다. 술집을 돌아다니며 시를 낭송하고 노래하고 술을 얻어 마신다. 하지만 요스트의 주인공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사랑을 받는다. 바알의 무대는 어둡거나 비극적이지도 않다. 하늘, 구름이 떠 있는 따사한 자연의 품속에서 바알은 끝내 사라질 뿐이다. 서곡으로 “위대한 바알의 찬가”(Der Choral vom grossen Baal)가 붙어있다. 바알이 나타났다가(1연)- 바알은 떠나간다(18연), 즉 삶과 죽음을 순회한다. 아래는 마지막 연이다.
어두운 땅덩이의 품속에서 바알이 썩어갈 때
하늘은 여전히 넓고 조용했으며 한 점 빛깔도 없었다
앳되고 벌거벗은 채로 끔찍하게도 아름다웠다
바알이 언젠가 사랑했던 그대로, 바알이 떠나갔을 때.
요스트가 그린 천재 시인은 이상적인 세상을 찾아 헤매다 죽어간다. 브레히트의 주인공은 처음 제목에서 보여주듯 먹고, 사랑하고, 시를 짓는다.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현실세계로 내려온다. 바알의 이런 사랑은 오히려 아름답고 순수하며 때로는 종교적이기도 하다. “숫처녀의 엉덩이를 움켜잡게 되면 자네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갖는 불안에서 벗어나 황홀감에 빠져 끝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야.”

1918년 5월 베데킨트가 죽었다. 그런 거대한 인간이 죽을 것이라고 브레히트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장례식에 참여한 검은 정장에 실린더를 쓴 신사들이 브레히트의 눈에는 거슬렸다. 이 고명한 문인들 뒤에 창녀, 유랑인, 꼽추 등이 뒤따랐다. 브레히트는 바알이란 주인공을 자기의 우상인 베데킨트를 쫓아 아름답고 거대하고 거친 짐승으로 그렸다. “그런 인간은 영혼 따위는 없을 거야. 거친 동물이나 다름없지.” 브레히트가 살던 시대는 절제, 헌신, 질서, 희생을 요구했다. 바알이 추구하는 방종, 쾌락 같은 생활방식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응당 피해야 될 분위기였다. 배데킨트의 작품(룰루-비극)도 외설적이란 이유로 호된 재판(1904-1906) 을 받으며 한동안 판매, 공연 금지가 되지 않았던가! 시민사회의 성도덕을 무너트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알]은 표현주의연극에 반기를 든 문학적 저항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굴레에 갇혀있던 그 당시의 사회정서에 대한 반감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바알]을 이런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시대정신에 대한 저항과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바알은 반사회적이다, 그런 반사회적 사회속에서는.” (Baal ist asozial, aber in einer asozialen Gesellschaft./Baal is asocial, but in an asocial society.)
브레히트에게 예술은 천재들만이 갖는 이해할 수 없는, 지고한 경지의, 외로운 투쟁은 아니다. 바알에게 삶은 존재 그 자체이며 예술은 삶의 일부이다. 동시에 예술을 통한 삶의 승화를 삶과 일치시킨다. 바알은 끝내 자연으로 돌아간다. 마지막 순간 밝은 하늘을 찾아 방에서 나가려 한다. 문지방을 기어나가며 “엄마!”를 부른다. 자연인 바알 속에는 베데킨트가 들어있다. 비용, 랭보, 베를렌 등 시인들 속에 반사회적 바알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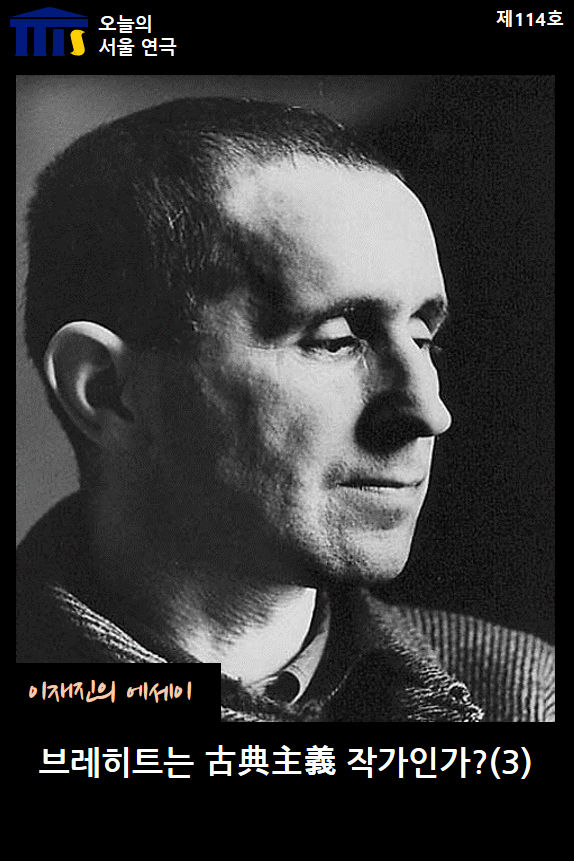
오자가 몇 개 보이네요.
헵벨은 비엔나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 헵벨은 빈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
나는 헵벨 보다 더 진지하게 쓸 수 있어 > 나는 헵벨보다 더 진지하게 쓸 수 있어
이 마을의 어린 처녀를 하룻밤 자신에게 받칠 > 이 마을의 어린 처녀를 하룻밤 자신에게 바칠
호라츠 > 호라티우스
Hanns Johst > Hans Johst
Baal ist asocial, aber in einer asozialen Gesellschaft > Baal ist asozial, aber in einer asozialen Gesellschaft
1) 노박사와 나는 언젠가 “aurora”의 표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나는 아직도 ‘오로라’로 쓰지 않고 ‘아우로라’로 쓴다오. ‘비엔나’, ‘호라츠’도 ‘빈’, 이나 ‘호라티우스’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해 보렵니다. 벌금을 낸다 해도!
2) Hans Johst는 ‘Hanns’ Johst로 고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이름은 일부러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으로 둔갑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굳이 변명을 찾아 보려니 늙어가는 나이 밖에 없구려!
3)“Baal ist asocial, aber in einer asozialen Gesellschaft.”에서 영어단어는 ‘asozial’로 바꿉니다. 왜 그리 되어 있는지 나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오. 용서하구려. 전공분야에서 손을 뗀지 10년이 훨씬 더 되었다고 변명삼아 둘러대 볼 뿐이니!
이 에세이를 꼼꼼히 읽어보는 독자가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한편 조심스러워 지는구려. 앞으로 그런 오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지요. 하지만 글 내용에 대해서도 몇마디 지적을 해주었다면 더욱 고마웠을 것을!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ㅎㅎㅎ
저는 그래서 브레히트가 좋은가 봅니다
브레이트 본인은 시대극 작가가 되기보다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는 고전주의 작가가 되고싶어 했지만, 글쎄요 저는 브레이트에 대해, ‘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 고전주의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글 잘 읽었습니다. 참고로 문학 하는 사람들은 오자가 발견되면 못견뎌하지만, 요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안씁니다.ㅎ
크노프(Jan Knopf) 교수는 브레히트를 “21세기의 괴테”라 부릅니다. 브레히트의 주인공들은 고전적 인간성을 내 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셰익스피어, 괴테나 실러의 주인공들처럼!” 이 에세이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브레히트는 이념에 갇혀 있던 시대적 작가인가, 아니면 얼마나 보편적 문제를, 그런 인물을 창조했는가?”등 입니다.